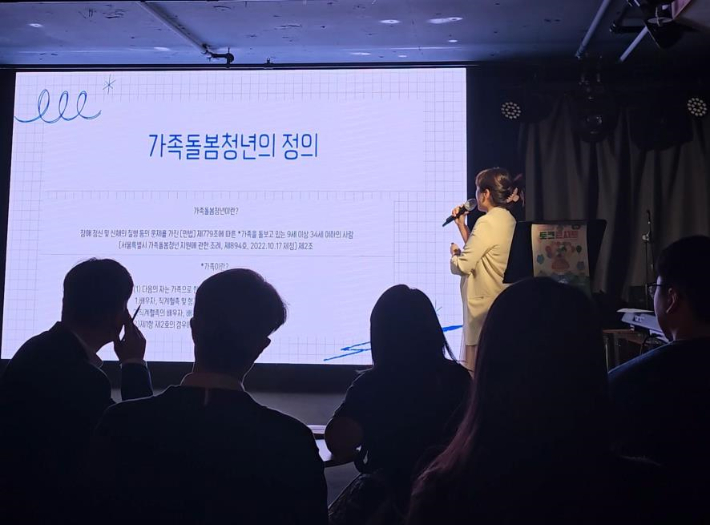 2024년 10월 28일 가족돌봄청년 정책토크콘서트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정책제안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24년 10월 28일 가족돌봄청년 정책토크콘서트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정책제안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서울의 한 유명 대학교 학생 A(21)씨는 학업과 가족돌봄을 병행하고 있다. 말이 병행이지 가족을 돌보는 일이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지적 장애인 형은 온전히 A씨에 의존해 연명해가고 있다. 특히 어머니는 암 환자이기도 하다.
아버지는 가난 때문에 학교를 다닌적 없는 문맹자라 번번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자활근로(공공근로)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중이라 A씨 역시 일찍부터 생활전선에 나섰다.
그가 고3 때인 2023년엔 더 혹독했다. 아버지가 채무 보증을 잘 못 섰다가 통장은 물론 집안 가제도구까지 몽땅 압류를 당했다.
A씨 가족은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복지재단(대표 진수희)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 이전까지만해도 채무 보증 문제만을 상담했을 센터는, 때 마침 설치된 가족돌봄청년지원팀(지원팀)에 A씨의 딱한 처지를 공유했다.
지원팀은 민간 후원 사업을 A씨 가족에 연계시켜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했다. 주민센터에도 별도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도 해줬다.
또 A씨 아버지가 채무 면책 받도록 파산선고를 지도하고, 압류에 나선 카드사에도 압류 대상에서 가전제품은 규정대로 빼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모두가 그 무렵 시행된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 덕분이다. 지원팀이 없었다면 A씨와 그 가족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를 일이다.
서울시의 도움 이후 A씨도 학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어 그해 겨울 서울의 유명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다.
A씨처럼 이런 작은 행운도 없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청년들은 전국에 18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가족 돌봄과 생계 부담 상황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될 위험이 큰 위기의 청년들이다.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오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테나에도 그 위기의 청년들의 존재가 비교적 빠르게 포착됐다.
서울시가 2022년 10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이들을 '가족돌봄청년'이라는 이름의 사회복지 대상자로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조례를 제정해 본격 지원한 것도 그 때문이다.
서울시복지재단에 지원팀을 꾸린 것은 그 이듬해 8월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원대상으로 '발굴'한 가족돌봄청년은 894명에 불과하다. 서울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대상자 3만 3천명의 2.7%에 불과하다.
지원팀의 임지연 팀장은 "자신이 지원대상인지 자각을 못하는 청년들도 많고, 낙인효과 때문에 지원을 꺼려하는 청년들도 있다"며 "관련 행정부서조차도 이들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지원 대상을 발굴하는 것이 현재 가장 힘든 일이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도 시 차원에서 대상자 발굴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다.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조사와 연계해 올해 두 차례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찾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선 자치구들과 협업해 일상적인 발굴이 가능하도록 연계 모델도 개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디딤돌소득․서울런 등 기존에 70개였던 공공 서비스 연계프로그램을 158개로 확대해 돌봄 경험을 공유하고 긍정적 정서 형성을 도와줄 네트워크,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생계, 주거,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공공·민간기관도 7개 기관(LH, 기아대책, 초록우산, ㈜365mc, 효림의료재단, 서울사회복지협의회, KMI한국의학연구소)으로 늘렸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한창 미래를 그리고 꿈을 향해 달려나가야 할 시기에 가족을 돌보며 '가장' 역할을 하느라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발굴부터 지원까지,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정책을 더욱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