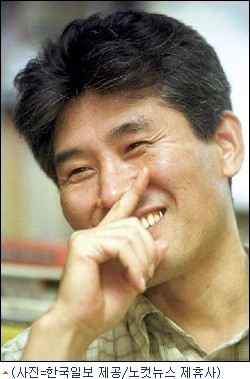 파일의 검색어를 반드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의 검색어를 반드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국민성은 들쥐와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그 지도자를 따라갈 것이며, 한국인에게는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다.''''
지난 80년 8월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었던 존 위컴이 한 말이다. 원래의 발언과는 달리 다소 왜곡되게 알려진 건지는 모르겠으나, 위컴이 ''''들쥐''''라는 단어를 쓴 건 분명하다.
당시엔 ''''망언''''이라며 펄펄 뛰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들쥐''''라는 단어 대신 ''''레밍''''이라는 원래의 단어로 알려졌더라면 사람들의 반응은 좀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람쥐도 쥐는 쥐지만 누굴 다람쥐같다고 부르면 날렵하다는 느낌을 줄 뿐 부정적인 의미는 없다. 레밍이라는 동물도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나그네쥐''''다. 들에 사는 모든 쥐를 들쥐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어떤 들쥐도 레밍처럼 무리 중의 ''''지도자''''를 따라 바다를 향해 질주하진 않는다. 들쥐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을 생각할 때에 레밍을 들쥐로 번역하는 건엔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집단적으로 지도자를 잘 추종하는 성향을 가리켜 ''''들쥐떼 근성'''' 대신 ''''레밍 기질''''이라 부른다면, 그리고 그걸 민주주의 자질과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한국인에게 레밍 기질이 좀 있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게다.
그러한 레밍 기질을 가리켜 ''''대세 효과'''' 또는 ''''눈덩이 효과''''라고도 한다. 어떤 쪽이 대세다 싶으면 사람들이 그쪽에 줄을 서 그쪽을 절대 우위로 만들어주는 건 정치판에서 자주 나타나는 일이다. 또 지도자가 집단 의사를 무시하고 홀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에 결코 수긍할 수 없는 사람들도 지도자와의 의리?정실?이해 관계 등으로 지도자를 추종하는 것 역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지난 90년에 이뤄진 ''''3당합당''''이야말로 대표적 사례다. YS가 이끌던 통일민주당의 민주투사들은 처음엔 그간 타도 대상이었던 민정당과 당을 합칠 순 없다며 YS와의 결별을 선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YS의 뒤를 따랐다. 말을 바꾼 사람들은 나중에 한결같이 YS와의 정(情)과 의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노라고 답했다.
이는 공사(公私) 구분을 못했다는 점에선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겠지만, 리더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보자면 YS의 탁월한 능력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은 YS와 같은 ''''보스 정치'''' 리더십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었기에 실패로 돌아간 동시에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도의 차이일 뿐 지도자 추종주의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높은 인구밀도와 동질적 획일성 때문이겠지만, 한국은 홀로 살기가 어려운 사회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보장해주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집단이 필요하고, 바로 이 필요성이 지도자 추종주의를 낳는 온상이 된다.
어이 하랴. 바뀌지도 않을 지도자 추종주의를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사회발전에 이용하려는 역발상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느 분야건 진보적 학문과 실천은 ''''민중 파워''''를 앞세워 리더십의 가치를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과연 현실적이며 정직한 판단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리더십 연구를 많이 하면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키워나가야 한국사회가 크게 발전할 것 같다.